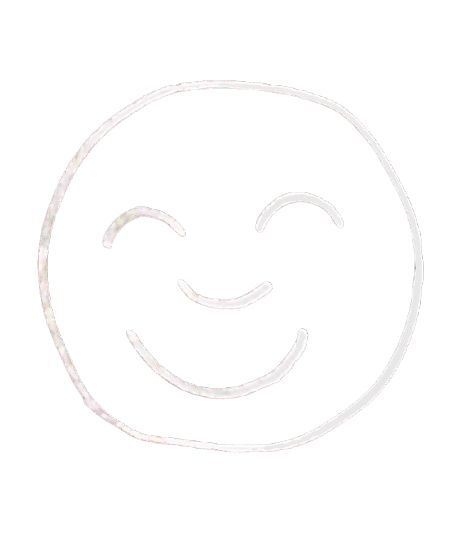2021. 5. 23. 17:57ㆍ매일/번역
1) “그 ‘결승선'이란건"을 “게임의 ‘결승선'은"이라고 바꿨다. “그"나 “이"와 같은 지칭어를 영어에서의 “the”나 “that”처럼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겠단 생각에서 그랬다.
2) 이번 글에선 “누스트 노드폴-엑스페디션(Neueste Nordpol-Expedition)” 과 같이 한국에 없는 개념이거나(해외에서 발명되었고 그만의 명칭이 있는데도 한국에선 딱히 널리 알려지지 않은 개념) 영어가 아닌 언어의 이름을 지닌 개념은 소리가 나는데로 했는데 내 멋대로 해석해서 원래 뜻에 맞게,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야 했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차피 원문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위한 글이었고 헝가리어나 네덜란드어는 모를텐데도 다른 특별한 해석없이 문자 그대로 넣었으니 지금의 선택이 맞다고 봐야 하는지 조금은 헷갈린다. 일단 이번 글에선 소리나는대로 쓰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자.
3) 이게 맞나 싶었는데 transliterate 의 뜻은 다행히 내가 생각한 대로 ‘음역'한다는 뜻인가 보다, 앞으론 당당하게 쓰자.
4) 수동태에 대한 고찰*: “‘라운 더 월드 윗 넬리 블라이(Round the World With Nellie Bly)’는 뉴욕의 하퍼 브로즈(Harper Bros.)사를 통해 1890년 발표되었다.”이란 문장을 보자. 원론적인 문법에 꽉 막혀 숨도 잘 못 쉬는 한국인이 보았을 때 “발표되었다"라는 표현은 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동태를 쓰지 않기 위해 “뉴욕의 하퍼브로즈"를 주어로 바꾸면 그 맛이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는 좋네 안 좋네 하기 전에 문맥 속 문장의 의미와 그에 맞는 주어 설정을 똑바로 의식하고 생각하는 버릇을 들이는게 훨씬 더 나은 자세라는 결론이다. **또다른 예를 보자: “프랑스 혁명이 생겨난 후엔”에서 “생겨난"을 두고 정말 “생긴"이라고 하는게 맞나? 프랑스 혁명이 생각을 하는 생물로서 “아, 이제 생겨야겠다! 읏차!” 하고 세상에 내려온게 아니잖아. 정말로 “벌어지”거나 “생기"는 일들이 이 세상엔 있는 것이다. 불필요한 수동태를 지양하자는 말인줄은 알면서도 간혹가다가 그 말만 신봉하면서 정확한 정의 없이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그럴 때마다 속에선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적어본다.
5)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2번에서 말한거랑 다르게 ‘The Game of Goose’는 ‘거위 게임'이라고 번역해버렸네. 이번 에세이는 번역 다 한 다음에 명칭같은 것들 다 한 번씩 체크해야겠다, 필수적으로.
6) 일전에 약자는 철자 사이사이 온점을 꼭 찍어주고 마지막 글자 뒤에도 점을 찍거나 아예 온점없이 대문자만 적는다고 적었는데 이에 추가할 내용이 떠올랐다. 온점을 쓸 경우 온점과 다음 글자 사이의 공간은 띄어주는 것도 중요해.
7) 아, 아무래도 게임의 이름이나 제목같은 고유명사는 그냥 음역하지말고 의미를 내 뜻대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번역해내야겠다. 한계가 크네. ‘독자와 가까워지는 번역’이 목표라면 이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뭐냐. 뭐지… 어, 그 이탤릭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것도 퇴고할 때 좀 통일시켜.
8) “martial”은 “전쟁의, 싸움의"라는 뜻인데 “martial figure”는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어렵다. 이것도 분명 마냥 아쉬워할게 아니라 옆으로 넘어갈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머릿속으로 굴러가기라도 하라고 적어나본다.
오늘 단어장에 넣어둔 친구들: transliterate (속시원) / frivolity (마찬가지로 속시원) / decree (Verb) / revolutionary (noun) / feudal / Bastille (역사공부하자, 진짜) / Union Jack (싱기방기) / circa / ardent / martial / crescent (cute)
'매일 > 번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05/25: 관중이 뛰쳐나갈 때 연주자가 어련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란 (0) | 2021.05.25 |
|---|---|
| 2021/05/24: 쌀국수는 이름이 길수록 그 맛이 좋다 (0) | 2021.05.24 |
| 2021/05/22 (0) | 2021.05.23 |
| 2021/05/21: 피지(FIJI)는 정말로 물맛이 좋습니까? (0) | 2021.05.21 |
| 2021/05/20 (0) |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