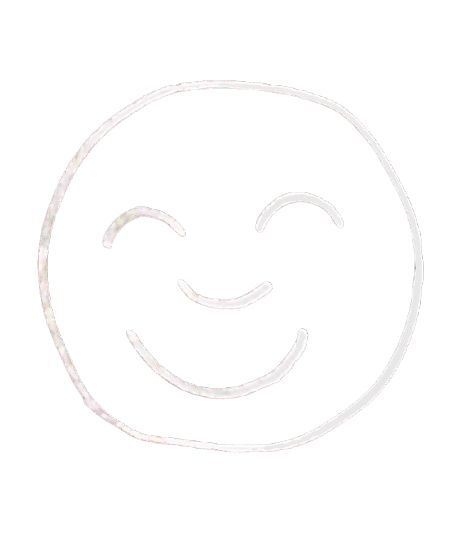2021. 5. 24. 16:44ㆍ번역/비문학
게임은 진행중:
역사의 의미와 보드게임
글쓴이ㆍ 알렉스 안드리스(Alex Andriesse)
번역ㆍ오성진
"플레이어들중 말을 종착지까지 가장 먼저 데려가는 사람이 우승한다." 이러한 포맷은 18세기 19세기 고대 보드게임의 전형적인 형식이었다. 본에세이의 필자, 알렉스 안드리스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사상과 국가의 가치관이 어떻게 게임말들을 통해 보드위에 되살아나는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원문 게시일ㆍ2014년 2월 21일
일만 년전, 신석기 시대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자기를 만들지도 못 하던 때 사람들은 납작한 돌판에 두 줄 이상의 구멍들을 파놓고 게임을 즐기곤 했다. 3,0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 고대 이집트가 초기왕조시대에 이르렀을 땐 보드게임은 상형문자를 통해 나타나기도 했는데, 기원전 12세기경 세워진 네페르타리(Nefertari) 여왕의 묘비에는 그녀가 고대 이집트 보드게임인 세네트(Senet)를 하고있는 모습이 묘사되어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인들은 '백가몬(backgammon, *역주: '주사위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의 조상격인 게임 '타뷸라의 늑대(Tabula)'를 만들었으며 로마인들은 체스의 조상격인 게임 '라트론즈(Latrones)'를 개발했다. 동양권 전반적으로는 '투웨니 스퀘어즈'(Twenty Squares)라는 게임을 즐겼으며 고대 중국에선 '리우보(Liubo/六博)'를, 고대 인도에선 훗날 빅토리아 시대 당시 식민 통치 국가 출신의 영국인들의 자국으로 옮겨가 '뱀과 사다리 게임(Snakes and Ladders)'을 변형시킨 게임, '모크샤 파탐(Moksha Patam)'을 즐겼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걸까? 식민지 국가들은 모두 그 시대를 대표하는 보드게임이 존재했다.
다양한 모양의 그림 또는 구멍으로 이루어진 보드게임 판들은 대부분 추상적인 편에 속했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원작자 불명의 게임들은 17세기까지 단순한 고대 발명품으로만 치부되어왔다. 그렇지만 계몽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룩하고 난 후로 유럽의 보드게임은 --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18세기가 끝나갈 무렵엔 시장의 시대적 취향을 맞추기 위해 페리를 타고 여행하는 내용부터 서로의 땅을 침략하는 내용의 게임들이 많이 제작되었다. 더 나아가서 보드게임은 소비자(당시 전엔 쓰이지 않던 명칭)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특정 장소나 사람이 그려진 보드 위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ㅂ터 벤자민이 “신선함과 경악스러움"이라고 표현한 대중의 갈증, 이를 위해 나선 또다른 집단은 바로 보드게임에 쓰일 그림들을 제작한 화가들이었다. 그들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대중의 눈과 상상력을 사로잡을만한 그림들을 내놓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탄생한 그림이 실린 게임들중 대부분은 ‘뱀과 사다리 게임’이나 ‘거위 게임(the Game of Goose)'과 같이 두 명 이상의 플레이어들이 팽이나 주사위 같이 “무작위로 숫자를 지정해주는" 도구를 이용해 경주하는 게임이었다. 각 트랙에는 게임 고유의 안전한 공간, 위험한 공간, 그리고 지름길이 독특하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모든 경주게임의 목표는 가장 먼저 자신의 말(들)을 경주로의 마지막 칸에 도착시키는 것으로 동일했다.

한편, 18세기와 19세기 경주게임이 지닌 주제와 미적 요소는 그 범위를 넓게 가졌다. 네덜란드계 게임 ‘스팀보트 게임(Stoomboots Spel, 기선(Steamboat)을 닮은 말을 이용해 즐기는 게임)’을 예로 들어보자. 직접 손으로 페인트칠한 것이 훤하게 티가 나는 게임의 요소는 모두 아이같은 느낌을 맘껏 뽐낸다. 게임 속 그려진 인물들과 풍경들은 미국 전통 초상화가 조셉 데이비스(Joseph H. Davis)나 조셉 레빗(Joseph Warren Leavitt)풍의 그림에서 느껴질만한 감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로테르담-도르드레히트(Rotterdam-Dordrecht)의 기선 선박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게임의 목표는 단순명료하다. 어떤 위험요소에도 무릅쓰고 도르드레히트의 선박에 도달하는 것. 그중 이 위험요소라는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 이중엔 예네버르(Jenever, **네덜란드의 진으로 만들어진 술 이름) 한 잔, 커피 한 잔, 또는 마차 타기가 있다. 페스투이스(The Pesthuis, 또는 전염병을 몰고 다니는 말)이 보드 위의 유일하게 어두운 이미지를 지닌 대상이다.

그에 반해 1790년, 런던에서 발표한 ‘더 뉴 게임 오브 휴먼 라이프(The New Game of Human Life)’는 '스팀보트 게임'보다 훨씬 덜 명랑한 내용의 게임이었다. 글이 많았으며 그중 신교도의 교리 또한 많이 담고 있었던 이 게임의 판은 '거위 게임'을 모델로 삼아 제작되었다. 여기서 (위에서도 많이 언급된) '거위 게임’이라 하면, 18세기 후반 유럽문화에 제대로 안착한 게임 중에 하나로 괴테 마저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있을 정도이다.
인생은 거위게임과 같다:
멀리 갈수록,
더 빨리 일찍 그 끝에 도달할 것이며,
그 끝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장소이다.
(Life itself was like a Game of Goose: The further you go, The sooner you reach the end, Where no one wants to be.)
당연하게도, ‘더 뉴 게임 오브 라이프'내에서의 목표는 가장 첫 번째로 노인이 되는 -- 게임의 말에 따르면 “84년동안이나 살아있던 불사 인간… 오로지 영원만이 잠재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 것이다. 이건 플레이어의 말이 삶의 구간을 (갓난아기 시절부터 노년까지) 7개로 나눠 표현한 총 여든세 개의 네모칸을 지나며 “도덕적 질문이나 사람들의 눈치"를 대면하면서 마지막 칸 까지 가야 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 적어도 '스팀보트 게임'에서 처럼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며 예네버르 한 잔이나 커피 한 잔 따위의 가벼운 장애물에 신경 쓸 일은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발전의 개념,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있는 앞으로 간다는 뜻의 발전의 개념,은 보드게임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았다.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의 유럽에서 태어난 수많은 게임들은 계속해서 누가누가 더 빨리 결승선에 도달하냐를 쟁점으로 설정하곤 했다. 게임 속에서 마련된 결승선이란 ‘스팀보트 게임’에서의 도르드레히트처럼 도처에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호주와 헝가리의 합작 ‘최신 북극 탐험(Neueste Nordpol-Expedition, 칼 웨이프렡(Carl Weyprecht)과 율리어스 페이어(Julius Payer)가 이끈 북극 탐사를 기리는 취지에서 만든 게임)’에서의 북극처럼 굉장히 이질적인 대상일 수도 있었다.

율스 베른(Jules Verne)의 베스트 셀러, ‘80일간의 세계일주(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는 영국의 고집스러운 신사, 필리어스 포그(Phileas Fogg)가 내기에 이기기 위해서 80일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돈다는 내용의 책이다. 필리어스의 세계일주는 보드게임으로 자리잡았으며 미국의 언론인 넬리 블라이(Nellie Bly)가 필리어스의 기록을 깨기 위해 떠난 (그리고 실제로 73일만에 뉴욕에서 인도를 찍고 다시 뉴욕까지 돌아와서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여정 또한 게임 안에 반영되기도 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 정치적인 의미를 지닌 “발전(진보)” 또한 보드게임 상에 피어올랐다. ‘더 뉴 게임 오브 라이프'에서의 도덕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던, 혁명가들은 보드게임이 경박스럽다는 이유로 탐탁치 않아 하면서도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의 목적에 맞게끔 게임의 내용을 변경시키기도 했다. 당대 혁명가들이 요일과 달의 이름을 일일이 바꾸고 달력 또한 재설정 하며 분과 시간을 그들의 뜻대로 설정했던 걸 고려해 보면 체스말 중 왕을 "앞으로 '혁명을 상징하는 깃발(le drapeau)'로 불러라"라고 하거나 당시만 해도 비어있던 카드 뒷면을 "귀족계층이 몰수당한 도서관의 그림으로 바꾸라"고 했던 사실은 그닥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추진력이 강했던 두 명의 혁명군, 좀므(Jaume)과 뒤구르크(Dugourc)는 아예 카드덱의 모든 그림을 바꾸기도 했는데 그동안 불쾌하게 여겨왔을 왕, 여왕, 발렛(영어권 덱에선 잭이나 네이브(knave)로 알려져있다)의 그림을 법을 대표하는 그림들과 평화의 기운을 상징하는 그림,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대체시켰다.

‘더 뉴 게임 오브 라이프’와 같이 1791년경 발표된 ‘프랑스 혁명 게임(Jeu de la Révolution française)’ 또한 ‘거위 게임'의 틀을 모델로 삼아 제작되었으며 정치적 진보정신을 널리 알림을 목표로 설정했다. 플레이어들은 게임을 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서 바스티유 감옥이 파괴된 사건에서부터 봉건제도를 무너뜨리는 과정, 프랑스와 천주교를 분리시키려던 시도, 9월 학살,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움직이던 데 러니(de Launy), 풀롱(Foulon), 베르티에(Bertier)를 사살한 사건과 같은 중요했던 사건들을 지나가도록 배치시켜놨다. 게임이 재미없게 들리는가? 아마 실제로도 열렬한 공화주의자를 제외한 모두에게 지루했을 것이다. 게임에 그나마 재미를 가미시켜주는 요소로는 “바보 기러기(idiot geese, 실제로 게임판이 이렇게 적혀있다)"가 있었는데. 치안 판사의 옷을 입고 있던 이 기러기들은 구체제를 고집하는 의회를 상징했는데, 이 기러기들은 플레이어의 말이 혁명의 끝까지 도달하는 길을 막음으로써 혁명을 최대한 늦추는 일을 맡았다.

이름부터 오묘한 ‘시간순으로 바라보는 세계의 별, 흥미진진한 게임(The Chronological Star of the World, An Entertaining Game)’은 1818년, 런던의 존 마셜(John Marshall)에 의해서 발매됐으며 이 게임에서야말로 정치적 진보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게임판에는 백아홉 가지의 가지각색 그림들이 별모양의 패턴 속, 초승달 모양, 메달 모양, 나뭇잎 모양 안에 그려져있다. 학자 에른스트 스트로할(Ernst Strouhal)의 말에 따르면 이 게임은 세계의 역사를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지한 인간들이 어떻게 논리라는 것을 다룰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역사를 잘 정립된 하나의 발전과정으로 차례차례 묘사해낸다”고 한다. 에덴 동산으로 시작을 알리는 이 게임은 참가자중 한 명이 중간에 있는 원에 먼저 도달하는 순간 끝난다. 중앙의 원에는 전투복을 착장한 여인이 유니언잭(Union Jack, ****: 영국 국기)이 그려진 방패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있다. 종이엔 “영국 노예제 폐지의 승리를 위하여(To the Glory of Britain Slave Trade Abolished)”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시간순으로 (...)’가 발표된 지 일 년 후인 1819년에 태어났다. 그 후, 1860년경 영국에서 나온 조금 더 국가주의적인 보드게임은 거의 당연스럽다시피 그녀를 데려다가 유니온 잭 방패를 든 여인의 자리를 채우게 했다. 이 게임의 보드엔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었는데 맨 밑의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 바벨탑, 로마의 영국 침략,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같이 가장 꼭대기 층에 닿을 때 까지 그녀가 원치 않는 결론에 다다르던 “여왕 말”은 그녀의 가족 품에 안기며 게임이 끝나게 된다.

게임을 통해 더 나은 위생과 정치의 발전을 도모해보려는 노력은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의 보드게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일정 부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소비에트 연방은 특히나 이런 면에서 보드게임을 잘 이용하는 쪽에 속했는데 -- 시민들로 하여금 혁명의 역사를 인지하고 외우게끔 게임을 이용한 프랑스 혁명군과는 조금 다르게 -- 소비에트 연방은 새로이 도시환경에서 살게 된 소작농들이 기본적인 보건과 위생에 관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애를 썼다. 1910년대와 20년대에는 ‘폐결핵: 하층민 질병(Tuberculosis: A Proletarian Disease)’, ‘신위생 게임: 조심해!(Look After Your Health! The New Hygiene Game)’,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이기기 위해선 나이가 어린 노숙자들을 보육원에 데려가야한다는” 내용의 게임인 ‘버려진 자들(The Abandoned)’ 까지, 러시아는 계속해서 시민 의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게임을 많이 배출해냈다.
1926년, 모스크바에서 발췌된 ‘건강한 삶(Healthy Living)’은 민간요법을 권장하는 사람과의 상담, 매독, 폐결핵, 그리고 알콜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 게임의 목표는 흥미로운 벌칙과 위험요소들을 피해서 가장 건강한 노동자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고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네덜란드의 ‘스팀보트 스펠’과는 확실히 많이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결승점까지 타오르는 예네버르 한 잔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가로막히는 것처럼 민간 의료인과 상담하거나 (무덤으로 향하게 된다) 모르는 여자와 눈이 마주친다거나 (매독이 생긴다), 점심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신다면 (노숙자 보호시설에 끌려가게 된다) 각각 상황에 해당되는 벌칙을 맞이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텍스트가 있는 칸은 플레이어들에게 다양한 수치(“살인의 46%와 강도사건의 63%는 술의 영향이 동반되어 있었다”)와 대중에게 잘못 자리잡힌 의학 상식(“폐결핵은 약에 의해 낫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공기, 햇빛, 그리고 음식을 통해 나을 수 있다”)을 깨부수려는 노력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짜임새있게 만들어진 게임판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건강은 결국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게임은 이마저도 부족했다고 여겼는지 게임판에 그려진 남성에게마저 한 손엔 규칙판을, 다른 손엔 플라이휠(*****기계나 엔진의 회전 속도에 안정감을 주기 위한 무거운 바퀴)의 레버를 쥐어 주었는데 플라이휠과 규칙판에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슬로건이 적혀 있다.

그림 출처 (*위 사진은 자유 이용 저작물이 아닐 수도 있음을 공지합니다)
‘건강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겐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라이프(Game of Life)’나 ‘모노폴리(Monopoly)’게임을 봐보자. 게임에서 강조하는 자본주의적인 목표를 두고 까무러쳤을 과거 러시아의 소작농들을 생각하면 사실 어느 한 쪽도 비난할 수는 없다. 종교, 노래와 마찬가지로 보드게임은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존재해왔으며 우리의 욕망과 편견, 그리고 두려움이 그대로 반영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피조물인 것이다. 가끔 ‘프랑스 혁명 게임(Jeu de la Révolution française)’처럼 지나치게 정치적일수도 있고 19세기의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배출한 다른 게임들처럼 자칫 무의식적으로 문화적 가치관을 내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보드게임이 각자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 없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공간을 만들어준 사실은 분명하다. 로베르토 칼라소(Roberto Calasso)의 말을 빌려보자면, “보드게임 게임판 위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논리의 세계와는 멀리 떨어진 일입니다. 보드게임을 즐기는 일은... 뭐랄까, 바닥에서 두 뺨 정도 붕뜬 채로 무언가를 부담없이 해낸다는 기분을 안겨준다”고 한다. 다양한 종류의 교훈이나 정치 사상이 한두개의 보드게임에 조금이라도 그 흔적을 남겨왔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 세계에서 일련의 발전 과정을 이렇게나 잘 복제하여 부담감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대체품은 별로 없다. 그리고 옳게만 보이는 발전에도 있을 수 밖에 없는 허점을 미리 보여주는 보드게임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다.
알렉스 안드리스(Alex Andriesse)는 2013년에 보스턴 대학(Boston College)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의 글은 그란타(Granta), 3:AM 매거진(3:AM Magazine), 그리고 밀리언즈(The Milions)에 게재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주 나올 예정이다. 그의 번역문으로는 ‘사후 회고록(Chateaubriand’s Memoirs from Beyond the Grave,1768-1800)’과 로베르토 바즐렌(Roberto Bazlen)의 ‘잡문집(Notes Without a Text, 2019)’이 있다.현대 문학의 비평을 하기도 하는 그는 유럽의 최고 문학선을 2권이나 편집하기도 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며 그의 트위터는 이 링크를 통해 찾아갈 수 있다.
원문링크: https://publicdomainreview.org/essay/progress-in-play-board-games-and-the-meaning-of-history
Progress in Play: Board Games and the Meaning of History
Players moving pieces along a track to be first to reach a goal was the archetypal board game format of the 18th and 19th centuries. Alex Andriesse looks at one popular incarnation in which these pieces progress chronologically through history itself, usua
publicdomainreview.org
'번역 > 비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12: The Public Domain Review, "현대 서양 의학에 대마초를 소개한 남자, W. B. 오쇼네시" (0) | 2021.06.11 |
|---|---|
| #011: The Public Domain Review, "1895년, 블랙 아메리카" (0) | 2021.06.01 |
| #009: The Public Domain Review, "미국을 싸웠던 복서, 존 설리반" (0) | 2021.05.21 |
| #008: The Public Domain Review, "고래잡이의 미학:난터켓 고래잡이 배에서 발견된 항해일지 속에서 숨어있던 그림들" (0) | 2021.05.14 |
| #007: The Public Domain Review, “짐승의 자국”:조지 왕조 시대의 영국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백신 반대 운동 (0) |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