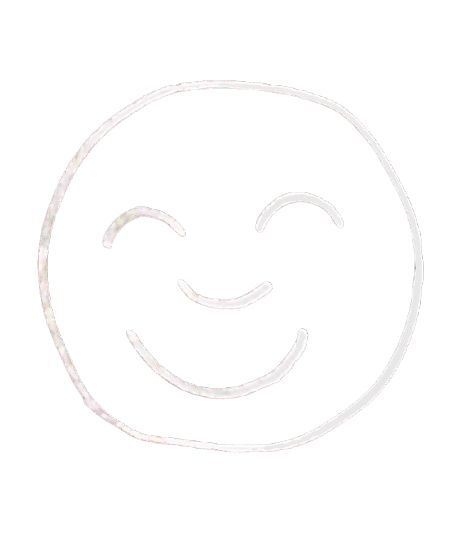2021. 4. 27. 22:42ㆍ번역/비문학
F. 스콧 피츠제럴드에 대해 하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
글쓴이 ㆍ스캇 도날드슨(Scott Donaldson)
번역ㆍ오성진
문학(...그리고 자유 이용 저작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2011년을 기준으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문서의 저작재산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는 몇 없을 것이다. 작가의 전기, '풀 포 러브: F. Scott Fitzgerald'(Fool For Love: Scott Fitzgerald)를 출판한 스콧 도날드슨(Scott Donaldson)이 피츠제럴드를 감싸고 도는 전설 속 잘못 알려진 상식, 그리고 그의 삶과 작품에서 여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밝혀낸다.
발간일ㆍ2011년 09월 26일

만약 ‘에드거 앨런 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미국 문학사에서 스콧 피츠제럴드만큼 개인의 사생활 때문에 작품세계가 평가절하되는 작가는 없었을 것이다. 피츠제럴드가 쓴 단편소설은 우리 문학사에서 완벽에 가까운 작품으로 남아있고 그보다 조금 더 길고 혼돈이 깃든 장편소설은 엄청날 정도의 감정적 힘을 지녔다는 사실은 무시받는다. 또한 그가 쓴 몇십 개의 이야기들이 오만가지 기준을 들이대도 거장의 작품이라고밖에 해석될 수 없다는 사실조차 무시받는다. 그의 권위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그는 현재 피츠제럴드라는 사람보다는 “재즈 시대를 기록한 인물” 또는 “예술가" 따위의 표현으로 포장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가장 널리 퍼진 편견이 반영된 호칭으로는 “재능이 다 타버려 재만 남은 작가"가 있다. 즉, 피츠제럴드의 비극같은 삶의 곡선은 평범한 후손들에게 그저 단순한 경고로 남아버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를 둘러싼 소문들은, 정도를 떠나서, 피츠제럴드를 좋아한다고 외쳐대는 사람들을 성공적으로 매혹할 수 밖에 없는 마력을 지녔다. 물론 그의 인생을 이해하기가 어려울법도 하다.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겐 택시 천장을 타고 다닌다거나 플라자 호텔 분수대에 둥둥 떠다니는 채로 발견되거나 술독에 빠져 살면서도 “낭비되어가는 황금 재능”이란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은 얼토당토 않고 전혀 옳은 일도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혹시나 그의 전기를 읽고 피츠제럴드의 삶의 방식을 시도해볼 생각이 들었다면 그 결정은 얼른 접어두시길.
물론 위와 같은 경고는 주로 암묵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교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사들인건 바로 두 연인간의 비극적인 관계였다. 글솜씨가 뛰어나고 미남인 동시에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작가, 피츠제럴드가 불안정하며 본인과 마찬가지로 종잡을 수 없는 젤다와 결혼한 건 여태껏 결과적으로 좋은건지 안 좋은건지 모를 일이다. 둘 사이엔 중독성 강한 맹독과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데 (아마 젤다보다는 스캇이 더 크게 흔들렸을거라고 예상된다) 둘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지만 결국엔 달콤한 독이 섞인 축배를 들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여러번 반복적으로 구전되면서 어째서인지 피츠제럴드 부부는 원인불명의 인기에 휩싸였으며 결국엔, 슬프게도, 헤어지는데까지 이르렀다. 1980년, 국립 초상화 미술관(National Portrait Gallery, DC)에서 열린 피츠제럴디아나(Fitzgeraldiana) 전시의 개회식은 이제는 사라진 피츠제럴드의 과거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가득찼다. 밴드는 피츠제럴드가 사망하고 10년은 지난 뒤인 1940년대의 글렌 밀러(Glenn Miller)나 베니 굿맨(Benny Goodman)의 곡들을 연주했다. 몇몇 여인들은 플래퍼 드레스(*역주: 피츠제럴드 소설 속 여성들이 자주 입는 의상)를 입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상은 그 날 연주된 음악만큼이나 피츠제럴드의 시간과 동떨어져있었다. 어떤 이는 식민지를 거느리던 시절의 “우아함”을 자아내기 위해 피쓰 헬멧(Pith Helmet)을 착용하고 춤을 추기도 했다. 자신이 살고있는 시대를 그대로 그려내기 위해 핏츠제럴드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던 디테일들은 그의 전설을 축복하기 위해 개회식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보였다. “젤다와 스콧”이든 “스콧과 젤다”든 그 둘의 관계는 “두 어린 청춘의 파괴적이고 연약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의 머릿속 깊은 곳에 남아 결국엔 20세기 작가중 가장 손꼽힐만한 그의 작품세계는 무시당하게 됐다.

전기 작가이자 소설가인 헨리 제임스(Henry James)가 주장했듯이 누군가에 대한 사실은 전부 알 수가 없다. “저희가 할 수 있는거라곤 이어지는 사실들만 연결할 뿐입니다.” 그가 말했다. 핏츠제럴드의 삶과 작품세계에서 가장 많이 연결되는 사실은 -- 이건 내가 몇십 년 동안 교실에 앉아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골똘히 눈살을 찌푸려가며 연구한 결과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인데 -- 바로 그에겐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충동이 넘쳐난다는 특징이다. 그는 다른 남성들을 즐겁게 해주려 했지만 쉽게 해내지 못했다. 프린스턴에서 그의 학우들은 그가 매사에 너무 호기심이 많으며 진지하지 못하다고 여겼으며 젤다의 아버지는 그가 믿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1920년대 중반의 그의 친구중 가장 친했던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결국 그를 멸시하기까지 했다. 반면 피츠제럴드는 여성을 즐겁게 해주는데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의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는 중성적인 작가측에 속하며 어떤 성의 캐릭터에도 본인을 동질화 시키지 못했다. “내 캐릭터는 전부 빠짐없이 한 명 한 명의 스콧 피츠제럴드입니다”라고 그가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 “내 소설 속 여성 캐릭터들 마저 여성성을 지닌 스콧 피츠제럴드이죠.” 18살의 나이에 그가 여동생 애나벨에게 제안한 말들을 돌아보면 이러한 그의 중성성에 더많은 논리가 붙는다. 그의 여동생이 적어낸 글에 따르면 그는 남성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유혹할 수 있는지 가르쳐줬으며 그 안에는 어떻게 자신을 더 잘 꾸밀지, 어떻게 춤을 출지, 무엇에 관해 말을 해야하며 애교를 부리는 방법도 포함되어있었다. 그의 중성성은 그가 적어내린 이야기와 소설들속에 짙게 묻어났는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여대생들이 그의 문학을 좋아하게 된 것도 같다.

예민한 감성을 지닌 그는 여성을 잘 대해야 할 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세심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알고 있었다. 청년 시절 그는 여성을 잘 꼬드겼다고 알려졌다. “당신에게 딱 맞는 형용사가 떠올랐어요,” 하고 그의 춤 파트너에게 이른 밤에 일러주곤 했으며 그 말을 들은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고도 남을 칭찬들을 그 위에 우아하게 얹을 줄 아는 그였다. 그는 여성의 말을 잘 들을 준비가 되었으며 그건 굉장히 적은 수의 다른 청년들만이 가진 능력이었다. 그리고 그는 여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두었다. 결혼한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여성들을 찬양했는데 이건 더이상 그가 어떻게 멈추거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여성들의 인정을 바랬으며 여기서 인정이라하면 그들의 사랑과 존경심을 뜻한다. 젤다 세이어 피츠제럴드(Zelda Sayre Fitzgerald)가 스콧 피츠제럴드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인이었을진 몰라도 그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랑이 아니었음에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다.
북쪽 시카고에 위치한 포레스트 호수의 -- 그녀가 살던 시대 당시에 가장 아름답고 부유했던 인물 중 하나였던 -- 지네브라 여왕이 그녀의 신분에 맞는 남성과 결혼하기 위해 피츠제럴드에게 퇴짜를 놓았을 때 피츠제럴드는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했다. 그녀에게 거절당하는 경험은 피츠제럴드로 하여금 절망하게끔 했으며 이는 당시 그의 소설속 여러 방면으로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의 소설속엔 그의 부인 젤다보다 그를 고생하게 만든 지네르바를 뿌리로 삼아 만든 캐릭터가 더 많을 것이다. 피츠제럴드는 플롯 속의 상황들을 바꿔가며 양성간의 차이를 다룬 이야기를 주제삼아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갔다.

그의 인생도 그러하듯이 그의 작품 세계가 피츠제럴드를 더욱 피츠제럴드처럼 만들어주는 요소는 바로 그가 쓰는 위와 같은 테마가 고도되는 과정이다. 그의 청년기 시절 그가 즐겼던 “꼬시기 게임"에서부터 그가 스스로 싸우며 배워야만 했던 남자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로 인해 펼쳐졌던 전쟁터만 같았던 그의 성장기까지 그의 소설 속 테마의 색은 짙어져만 갔다. 어쩌면 우리는 그의 데뷔작, 낙원의 이쪽(This Side of Paradise, 1920)을 읽으면서 아모리 블레인(Amory Blaine)이 그가 누군가를 매몰차게 차고 헤어졌다고 해서 로잘린드 코나지(Rosalind Connage)에게 그렇게 심한 엄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설득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피츠제럴드의 1925년 역작 속에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위해 죽었으며 밤은 부드러워(Tender is the Night, 1934)에서 딕 다이버는 니콜과 그녀의 가족에 의해 그의 생계수단을 빼앗겼다. 그렇게 그의 소설 속 남성들은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모습으로 나락으로 빠지는 모습이 비춰졌는데 피츠제럴드는 (젤다가 신경증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생겼을)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옮기고 싶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의 약점을 스스로 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밤은 부드러워' 같은 경우엔 특히나 더 인간의 매력이 얼마나 덧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특히나 여성들)을 즐겁게 해주는데 꽂혀있었던 다이버는 그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공들여 만든 작품을 버리고 사람 구실을 못 하는 지경에까지 치닫는다. 그 사이 진짜 피츠제럴드는, 그가 만들어낸 주인공과 같이, “남을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때문에 자신을 증오하며, 모두가 알듯이, 술중독에 빠지게된다. 음주는 피츠제럴드의 삶에서 전염병처럼 떠돌며 그의 캐릭터들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그의 예술성이 빛을 발한건 그의 인생에 후반기였는데 그 때는 그가 남을 즐겁게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차치하고 (이 계기는 할리우드에서 생겼을 것 같다) 술도 멀리하고 그가 말하는 “작가만이 진입할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가면서 부터였다.

미국의 가장 으뜸가는 문학계 전기 작가로써 스캇 도날드슨은 20세기의 미국 작가를 주제로 한 책을 여덟권이나 출판했다. 이중엔 미국의 시인: 윈필드 타운리 스캇(Poet in America: Winfield Townley Scott, 1972), 의지의 힘을 통해: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삶과 예술(By Force of Will: The Life and Art of Ernest Hemingway, 1977), 풀 포 러브, F. 스콧 피츠제럴드(Fool for Love, F. Scott Fitzgerald, 1983), 존 치버(John Cheever: A Biography, 1988), 아키바드 맥리시: 미국인으로서의 삶(Archibald MacLeish: An American Life, 1992), 그리고 1993년 앰배서더 상을 수여받은 전기 헤밍웨이 대 피츠제럴드: 문학계 우정이 지나온 곡선(Hemingway vs. Fitzgerald: The Rise and Fall of a Literary Friendship, 1999), 그리고 현대 시 포럼(Contemporary Poetry Forum)에서 '올해의 전기'로 선정한 피츠제럴드와 헤밍웨이: 그들의 작품과 삶(Fitzgerald and Hemingway: Works and Days, 2009)가 있다. 위의 기사는 미네소타 주립대 출판에서 새로 발행한 그의 풀 포러브: F. 스콧 피츠제럴드의 개정판의 서문에서 발췌해왔다.
원문출처: https://publicdomainreview.org/essay/a-few-words-about-f-scott-fitzgerald
A Few Words about F. Scott Fitzgerald
In most countries around the world, 2011 saw the writings of F. Scott Fitzgerald enter the public domain. Scott Donaldson, author of the biography Fool For Love: F. Scott Fitzgerald, explores the obscuring nature of his legend and the role that women playe
publicdomainreview.org